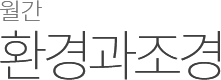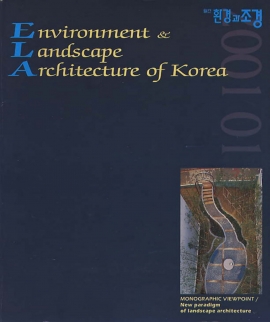쟝 클로드 위버
- 브장송의 프랑쉬 콩데 대학 교수. 16년 동안 CNRS에서 경관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1972년에서 1989년 사이 지리학의 방법론에 많은 기여를 했던 학회의 창설자 중 한 사람이다. 경관에 관해 100 편이 넘는 논설을 발표했고, 프랑스 지도 제작에 참여해 1995년 이란 책을 지도와 함께 발간했다. 특히 지도 제작의 개념과 방법, 지리학적 용어의 다의적(多義的) 활용에 관한 분석 등에 탁월한 학자이다.
조경의 기초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지도는 지리학적 개념에서 정리된 경관을 표현한 것이다. 지도를 잘 읽는 것은 단순히 지도상의 기호를 잘 읽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경관의 실과 허를 잘 짚어내는 것이며 지도라는 도식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경관 속에 숨은 현실적 경관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알아내는 것과 통한다. 지도는 경관에 대한 매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의 결과물이며 그 개념은 수학적이고 공식화(公式化)를 지향한다.
최근에 지형 분석과 지형도를 만드는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경관과 환경을 새롭게 정의해나가는 지리학적 조경의 경향에서 경관론은 방법론적으로 인문학적 경관론과 크게 구별된다. 이런 종류의 경관론은 인문학적 경관론이 생태학적 경관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잘 수용하지 못하는 반면 생태학적 시스템을 무리 없이 수용한다. 또한 사회학적 접근, 즉 거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개입에 대한 연구 또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경관론의 단점이 있다면 이미지와 오브제를 혼동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주민이 경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경관의 이미지인데 반해 지도상에서 과학적으로 표현된 경관은 이미지가 아닌 산, 들판, 강, 호수 등의 기호화된 오브제들의 집합이다.
또한 경관의 이미지는 대부분 경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만들어지는 인 시투(in situ)의 이미지인데 반해 지도가 표현하는 과학적 경관 이미지는 경관을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로서 경관의 일반적 이미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경관론은 근본적으로 조경에서 필요한 경관과 다른 차원의 경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칠 수 있다.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관론을 제시한 사람이 장 클로드 위버이다.
그는 과학적 경관론과 인문학적 경관론의 연결 고리를 경관의 다차원성에서 찾고 있다. 경관은 지리학적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념적으로 파악되며 오브제의 물리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정신적 차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상반된 두 차원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며 모호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이 곧 경관이란 것이다. 그는 이 두 차원의 모호한 결합을 "시각적 경관의 상자"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상자의 개념은 다소 연극 무대를 상상하여 만들어낸 개념이다. 경관이 마치 무대 위에 펼쳐지는 극의 장면과 같으며 각각 취향이 다른 관객이 다른 감수성과 다른 방법으로 그 장면을 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장면에 불과하다고 그는 경관을 해석한다. 경관의 복잡성은 곧 카메라 줌의 확대 축소 기능처럼 시각 상자의 연속적 겹침의 구조에 따른 것이고 오브제의 작은 상자에서 이미지의 아주 큰 상자까지 일종의 상하체계가 있는 것이 경관이고, 그 중 어느 한 상자만을 집어내어 경관론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각 상자들의 관련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런 관련을 그는 언어적 정의(定意)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관을 언어적으로 계속 정의해나가는 것이 곧 각 경관의 차원들의 관련을 계속적으로 밝혀내는 것과 통한다는 이야기이다. 다소 난해한 위버의 경관론은 마치 헤겔의 인식론처럼 형이상학적인 경관론을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리학자로서 매우 철학적으로 보이는 이런 경관론은 인문학적 베이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란 점이 흥미롭다. 과연 조경에 형이상학적 차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형이상학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런 형이상학은 필요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위버가 철학자가 아니라 지리학자란 점에서 자명해진다. 곧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가 구한 답은 형이상학 속에 있었던 것이다. 마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하이데거의 현상학이 발전되듯이 또한 구조주의에서 심리주의와 해체주의로 전이되며 포스트모던의 여러 난제들을 풀고 있듯이 구체적 현실의 해결은 항상 추상적인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의 조경 또한 오랫동안 선(禪)이나 기(氣)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에 몰두해왔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형이상학, 다시 말해 인식론은 어쩌면 조경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이런 입장에서 장 클로드 위버의 수많은 논설 중 몇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읽어보기로 하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박정욱 Park, Jung Wook·파리 소르본느대학 박사, Land Plus Art 연구소장
- 브장송의 프랑쉬 콩데 대학 교수. 16년 동안 CNRS에서 경관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1972년에서 1989년 사이 지리학의 방법론에 많은 기여를 했던 학회의 창설자 중 한 사람이다. 경관에 관해 100 편이 넘는 논설을 발표했고, 프랑스 지도 제작에 참여해 1995년 이란 책을 지도와 함께 발간했다. 특히 지도 제작의 개념과 방법, 지리학적 용어의 다의적(多義的) 활용에 관한 분석 등에 탁월한 학자이다.
조경의 기초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지도는 지리학적 개념에서 정리된 경관을 표현한 것이다. 지도를 잘 읽는 것은 단순히 지도상의 기호를 잘 읽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경관의 실과 허를 잘 짚어내는 것이며 지도라는 도식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경관 속에 숨은 현실적 경관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알아내는 것과 통한다. 지도는 경관에 대한 매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의 결과물이며 그 개념은 수학적이고 공식화(公式化)를 지향한다.
최근에 지형 분석과 지형도를 만드는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경관과 환경을 새롭게 정의해나가는 지리학적 조경의 경향에서 경관론은 방법론적으로 인문학적 경관론과 크게 구별된다. 이런 종류의 경관론은 인문학적 경관론이 생태학적 경관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잘 수용하지 못하는 반면 생태학적 시스템을 무리 없이 수용한다. 또한 사회학적 접근, 즉 거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개입에 대한 연구 또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경관론의 단점이 있다면 이미지와 오브제를 혼동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주민이 경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경관의 이미지인데 반해 지도상에서 과학적으로 표현된 경관은 이미지가 아닌 산, 들판, 강, 호수 등의 기호화된 오브제들의 집합이다.
또한 경관의 이미지는 대부분 경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만들어지는 인 시투(in situ)의 이미지인데 반해 지도가 표현하는 과학적 경관 이미지는 경관을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로서 경관의 일반적 이미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경관론은 근본적으로 조경에서 필요한 경관과 다른 차원의 경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칠 수 있다.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관론을 제시한 사람이 장 클로드 위버이다.
그는 과학적 경관론과 인문학적 경관론의 연결 고리를 경관의 다차원성에서 찾고 있다. 경관은 지리학적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념적으로 파악되며 오브제의 물리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정신적 차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상반된 두 차원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며 모호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이 곧 경관이란 것이다. 그는 이 두 차원의 모호한 결합을 "시각적 경관의 상자"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상자의 개념은 다소 연극 무대를 상상하여 만들어낸 개념이다. 경관이 마치 무대 위에 펼쳐지는 극의 장면과 같으며 각각 취향이 다른 관객이 다른 감수성과 다른 방법으로 그 장면을 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장면에 불과하다고 그는 경관을 해석한다. 경관의 복잡성은 곧 카메라 줌의 확대 축소 기능처럼 시각 상자의 연속적 겹침의 구조에 따른 것이고 오브제의 작은 상자에서 이미지의 아주 큰 상자까지 일종의 상하체계가 있는 것이 경관이고, 그 중 어느 한 상자만을 집어내어 경관론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각 상자들의 관련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런 관련을 그는 언어적 정의(定意)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관을 언어적으로 계속 정의해나가는 것이 곧 각 경관의 차원들의 관련을 계속적으로 밝혀내는 것과 통한다는 이야기이다. 다소 난해한 위버의 경관론은 마치 헤겔의 인식론처럼 형이상학적인 경관론을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리학자로서 매우 철학적으로 보이는 이런 경관론은 인문학적 베이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란 점이 흥미롭다. 과연 조경에 형이상학적 차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형이상학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런 형이상학은 필요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위버가 철학자가 아니라 지리학자란 점에서 자명해진다. 곧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가 구한 답은 형이상학 속에 있었던 것이다. 마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하이데거의 현상학이 발전되듯이 또한 구조주의에서 심리주의와 해체주의로 전이되며 포스트모던의 여러 난제들을 풀고 있듯이 구체적 현실의 해결은 항상 추상적인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의 조경 또한 오랫동안 선(禪)이나 기(氣)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에 몰두해왔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형이상학, 다시 말해 인식론은 어쩌면 조경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이런 입장에서 장 클로드 위버의 수많은 논설 중 몇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읽어보기로 하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박정욱 Park, Jung Wook·파리 소르본느대학 박사, Land Plus Art 연구소장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