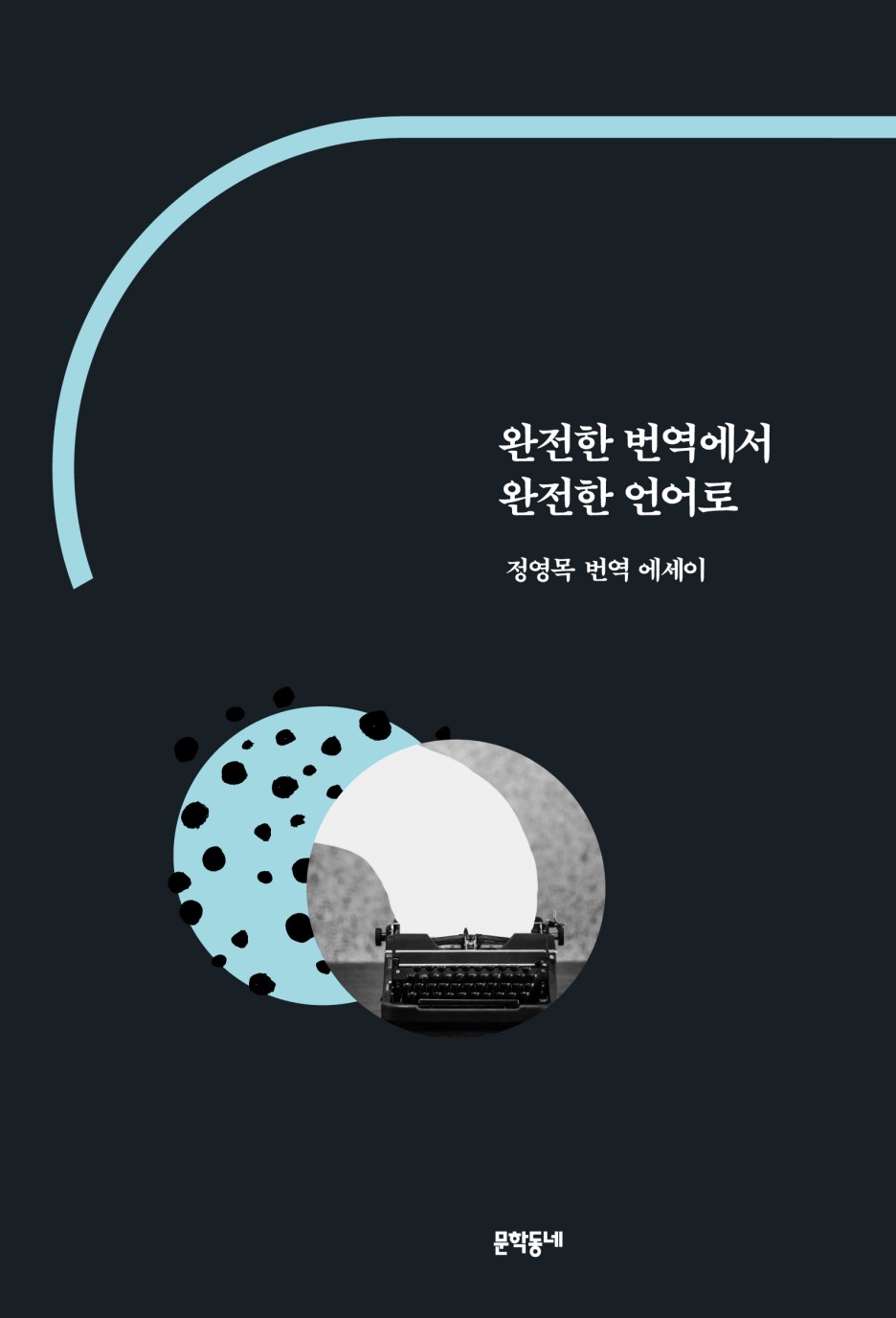
작가나 가수처럼 자신을 오롯이 드러내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타인의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하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로 옮겨야 하는 모순을 끌어안은 번역가는 ‘자기를 보여 주는 일’의 대척점에 놓인 사람이다. 원작은 완전한 타인의 산물이기 때문에 번역가의 목소리가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인지 27년차 번역가 정영목은 번역가의 정체성을 두고 작가보다 배우나 연주자에 가깝다고 말한다. 하지만 연기자나 연주자와 달리 번역가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미묘하다. 흔히 번역된 글을 두고 ‘이건 번역 같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말을 칭찬처럼 하곤 한다. 대패질한 듯 매끄럽게 다듬어진 문장, 번역 냄새가 나지 않는 글은 좋은 번역 혹은 옳은 번역의 사례로 여겨진다. 따라서 ‘번역다운 번역은 번역 같지 않은 번역’이고, 번역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번역을 하면서도 번역을 하지 않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딜레마 그 자체다. 번역가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 이쯤 되면 머리가 아파진다.
번역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나 ‘가독성’ 따위에만 머물러 있어서, 번역은 문학과 비문학을 모두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작업’만이 되어버렸다. 덕분에 인공 지능은 번역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엉터리로 번역한 문장을 두고 ‘번역기를 돌렸다’는 표현이 곧잘 쓰이곤 했지만 그것도 다 옛말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구글 번역기는 (적어도 영어에서만큼은)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꽤 신뢰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학교 과제나 회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급부상했다. 아무리 긴 글도 마우스로 긁어 복사+붙여넣기 하면 단 몇 초 만에 해석된 글이 눈앞에 짠 하고 펼쳐지니 외국어로 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덕분에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찾는 시간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성질이 급해져서, 내 컴퓨터 인터넷 창의 북마크 바 한가운데는 구글 번역기의 차지가 된 지 오래다.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는 번역에 대한 단상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번역가를 위한 실용서 같지만 번역 스킬과는 무관하다. 알랭 드 보통, 필립 로스, 어니스트 헤밍웨이, 커트 보니것 등 굵직굵직한 작가들의 책을 번역해 온 정영목은 문학성이 깊고 번역이 까다로운 소설의 적임자로 여겨진다.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균형 잡힌 번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는 편집자들이 ‘믿고 맡기는 번역가’ 중 하나다. 정영목은 번역 논의의 빈약함과 문장의 매끄러움에만 연연하는 인식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묵은지처럼 푹 묵혀둔 번역의 사회적 역할과 인문학적 가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자 한다.
전문 번역가는 넘쳐나지만 좋은 번역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연주자에 따라 곡의 해석이나 스타일이 전혀 달라지듯이 번역도 그러한 법인데 번역을 평가하는 기준은 직역 혹은 의역인지, 가독성이 좋은지 등의 단편적인 수준에만 그친다. 대신 번역 오류나 문체에 대한 논란과 질타가 번역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되려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를 가로막는다. 좋은 그림, 훌륭한 연주, 높은 수준의 소설을 평가하고 그 기준을 되묻는 것처럼 좋은 번역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번역이란 “불완전한 양쪽 언어에서 다른 완전한 언어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성기고 번역의 반은 상상”이다. 그래서 “번역가의 과제는 완전한 ‘번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언어’에 이르는 것”이 된다.1
저자는 그의 단상을 고민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맺는다. 그는 책의 마지막 장 ‘번역의 자리’에서 번역은 “서로 다른 두 언어가 뒤엉키고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서로 다른 인간들의 본질적인 교섭과정을 살펴보며 인간을 공부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2라며, 번역의 새로운 자리를 모색하는 물음을 던진다. 정영목은 책의 첫머리에서 번역가로서 번역에 대해 말하는 것이 번역 자체의 미진함에 대한 군색한 변명으로 비춰질까 걱정했지만, 그의 글은 변명보다는 분야에 깊이를 더하고 외연을 넓히려는 절실함으로 보인다. 건조하기만 한 문체에서 왜인지 모를 짙은 호소력이 느껴지기도 한다. 남의 것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는 일, 번역가와 편집자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직업성을 공유하기 때문일까. 나는 동종 업계도 아닌 남의 일 얘기에 여기저기 많이도 밑줄을 그어 놓았다.
편집부는 12월호 마감이 한창일 때 내년 계획을 짜느라 여느 때보다 더 분주했다. 내년 1, 2월호에 예정된 ‘젊은 조경가 특집’ 때문이었다. 12월호에 실릴 젊은 조경가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날, 처음 시도해 보는 기획의 가닥을 잡고자 수상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특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남기준 편집장은 특집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조경가 김호윤을, 이호영과 이해인을 ‘보여 주는’ 기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보여 주기. 한 인터뷰에서 정영목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좋은 번역은 빙산을 보여 주는 일이다. 일부는 위에 솟아 있지만 아래는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가장 풍부한 언어로 밑바닥까지 모두 긁어 보여 줘야 한다.”3 글과 도면, 사진 아래 숨겨진 설계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 또 한 사람의 설계관을 어떻게 번역해 독자에게 전달해야 할까? 책의 말머리에 실린 인터뷰에서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일이 번역인지도 모르죠”라고 답했던 번역가의 말에 묘하게 공감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각주 정리
1. 정영목,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문학동네, 2018, pp.166~167.
2. 위의 책, p.198.
3. 김기중, “[사람과 사람] 번역가 정영목”, 『문화+서울』 2018년 8월호, 서울문화재단, p.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