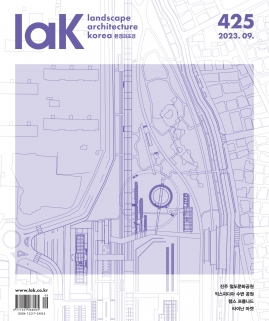소소한 일상이 한 편의 영화가 된다면 어떨까. 짐자무쉬의 영화 ‘커피와 담배’(2006)는 커피와 담배를 즐기는 이들의 일상을 11개의 단편으로 담아낸다. 사촌 간의 미묘한 질투와 손님에게 오지랖을 부리는 종업원,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배우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커피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혹자는 커피와 담배가 어지럽게 놓인 지저분한 테이블이 자꾸 나와서 금연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지루해서 다 보기가 힘들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자꾸만 보면 담배가 당긴다고 하더라. 비흡연자라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지만, 커피와 담배를 두고 다양한 인간 군상의 꾸밈 없는 일상을 보는 소소한 재미가 들었다. 농담과 수다, 오지랖과 질투 등이 교묘하게 뒤섞인 관찰 예능이라고 할까.
내가 만약 영화감독이 된다면 이러한 소소한 일상을 다룬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싶다. 제목은 ‘커피와 도서관’. 짐 자무쉬에 대한 오마주라고 하기엔 다소 민망하지만, 대개 영화감독이나 소설가들의 데뷔작이 자전적 이야기에서 출발하지 않나. 그래서 내 첫 영화도 자전적 이야기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개봉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지만 영화의 얼개가 되어줄 나의 이야기를 전한다.
커피와 도서관에 얽힌 첫 에피소드는 사실 상습적 연체와 관련이 있다. 학창 시절, 공부하러 도서관은 가는데 막상 가면 하기는 싫어서 교과서 대신 도서관 책을 잔뜩 빌려놓고 맨날 반납일을 까먹거나 덜 읽어서 늦게 반납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늘 연체료를 내고 남은 동전들로 주머니가 가득했고, 짤랑거리는 동전을 처리하려고 도서관 자판기 밀크커피를 연신 뽑아 먹었다. 미어캣처럼 도서관을 괜히 어슬렁거리는 동지(?)가 눈에 보이면 괜히 한 턱 쏘는 척하면서 자판기 앞으로 데려가서 같이 밀크커피를 마셨다. 한약방 벤치에 앉아서 근황 나누는 할머니들처럼 소소한 농담을 곁들이면서.
그때 공부를 좀 할 걸 그랬나 하며 후회하던 시절도 있었다. 백수라 쓰고 취준생이라고 읽던 그 시절, 집에서 빈둥거리기 싫어서 동네 근처의 정독도서관에 매일 같이 출석 도장을 찍었다. 시간이 많으니 책이나 원 없이 읽자는 마음도 있었지만, 구내식당 밥맛이 꽤 내 입에 맞았고, 점심 먹고 매점에 들러 캔커피 하나 들고 도서관 앞마당을 산책하곤 했다. 재잘거리며 서로를 앵글에 담는 연인들, 점심시간 잠시 틈을 내 등나무 퍼걸러 아래에 앉아서 책을 읽는 직장인, 천진난만하게 팔을 휘두르며 뛰어노는 꼬맹이들을 보며 괜히 왠지 모르게 공간의 ‘활기’가 내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요새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종종 일부러 짬을 내서 또 도서관에 간다. 한 재단이 유료로 운영하는 회원제 도서관인데, 약 2만여 권의 문학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술자리 두어번 안 가고 아낀 돈으로 가입하면 1년 간 이용이 가능하다. 공간을 둘러보면 예술적 취향이 대단한 장서가의 서재를 구경하는 기분이 난다.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과 문학, 철학 서적은 물론 작가별로 책을 구분해 둬서 장르 구분 없이 작가의 전작을 모두 구경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천득 선생님의 전작도 읽을 수 있고, 칸막이가 있는 1인용 소파에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도 있다. 또 입구의 카페에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들어가면 금상첨화라고 할까. 저녁에는 카페에서 칵테일도 판다고 하더라.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칵테일과 도서관도 꽤 좋은 조합일것 같다. 물론 두 발로 갔다가 네 발로 나오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생각해 보면 커피를 마시며 즐겼던 도서관이 내게 일종의 케렌시아(Querencia)였는지도 모른다. 투우에 출전하는 소가 결전을 앞두고 케렌시아란 장소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결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도서관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밀크커피로 시작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오기까지 꽤 세월이 흘렀지만, 언제나 늘 함께 해준 도서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너의 영원한 동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