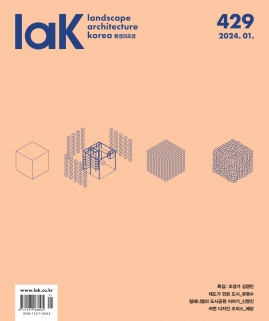에피소드 1
조경학 전공자가 아니고서야 도시 인프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공원’을 그 자체로 들여다보는일은 거의 없다. 일상의 한 조각, 매일 지나가는 하루의 어떤 배경. 그래서인지 조경학과로 넘어오기 전 내가 공원을 특정한 공간이자 장소로 인지한 날은 매우 뚜렷하게 남아 있다. 2013년 봄, 뉴욕 하이라인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뒤 계획서 초안을 들고 지도교수를 찾아간 어느 오후. 약 한 시간에 걸쳐 좀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될 만한 주제로 다시 가져오라는 조언을 듣고 발걸음도 무겁게 학교 건물을 나왔다. 지난 두 달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건만, 한숨 가득 꿉꿉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일부러 센트럴파크로 돌렸다.
80번가 인근 게이트를 넘어 작은 소로를 따라 15분을 걷다 보면 터틀 연못(Turtle Pond)이 나온다. 허벅지까지 오는 낮은 펜스가 있는 명상 공간으로 그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센트럴파크에는 여덟 개 명상 공간이 있는데,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촘촘히 짜인 공원의 다른 지역과 달리 휴식을 취하며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공원 초창기 옴스테드의 의도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펜스를 조심히 밀고 들어가 노트북으로 무거운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았다. 잔디밭에 주저앉아 무작정 연못을 한참 바라보다 잔잔한 수면이 지겨워 주변 사람들로 시선을 돌렸다.
사실 이곳은 명상의 공간이기보다는 ‘시끄러우면 안 되는’ 공간이다. 누군가는 책을 한 손에 쥐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그 옆에 드러누워 낮잠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브라운 백에서 조심스레 음료를 꺼내 순식간에 마시고 다시 집어넣는 것을 보니 분명 술이다. 각자의 행동은 다르지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공원의 이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결정했다는 점. 뒤편 낮은 둔덕 위 이리저리 겹치는 소로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그 사이사이에 깔린 잔디는 공원을 향유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임시 거처가 된다. 그 밑으로는 다리 아랫길이 있어 돌벽을 울림판 삼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 석사학위 논문 계획서 파일을 새로 열었다. 대단한 발견도, 의미심장한 마음가짐도 없이 무작정 센트럴파크를 주제로 잡았다. 그렇게 내 첫 석사논문을 썼다.
공원,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른 새벽 양팔을 열 맞춰 흔들며 공원을 거니는 어머니들, 점심시간 삼삼오오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건 채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는 회사원들, 자전거 타고 공원을 통해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주말이면 으레 손을 꼭 붙잡고 공원을 거니는 예쁘게 차려입은 연인들. 물론 종종 시끄럽고 환경에 저해되는 행동도 목격되지만, 그조차도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이 무엇이든, 공원은 분명 바쁘고 정신없는 도시 일상에서 순간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도시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 그 전에, 도시공원이 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 되었을까? 일련의 질문 끝에 결국 답은 내 자신, 즉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일상에 놓여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렇게 시작한 기획이 이 글, ‘밀레니얼의 도시공원 이야기’다.

아파트 공화국의 공원
1988년 9월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뒤집어 놓았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아보 자면, 올림픽대로가 뚫렸고, 한강 정비 사업이 진행됐으며, 잠실주경기장이 완공됐을 뿐 아니라 올 림픽공원이라는 대규모 기념 녹지가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따라 오기 시작했고, 아파트 숲에서 태어나 아파트로 은퇴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았던가.
나 자신을 포함, 이 시기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밀레니얼은 그 전의 세대와 분명 다른 도시를 경 험했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태어나 그 확장을 지켜보며 자랐고, 여러 신도시의 흥망성 쇠를 지켜보며 도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대단지 아파 트의 부정적 측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유년 시절을 다시금 생각해보면, 텔레비전 속 ‘아파트 112 perspective 공화국’과 내가 살았던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 결국 이 아파트 공화국에 살아가던 내 어린 시절이 그렇게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다.
‘아파트 공화국’ 서울과 내가 설던 서울은 무엇이 달랐을까? 지금도 콘크리트 숲을 사랑하는 조경 이론 연구자로서 생각해 보건데, 그 간극에는 ‘조경’이 존재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파트 공화국은 직사각형 상자의 끝없는 연속으로만 존재하는 장면이었고, 내가 사는 아파트 도시는 공 원과 수공간, 광장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그 사이를 채우는 아파트 단지들의 연속이었다. 땅에 발 을 딛고 천천히 ―물론 딴에는 재빠르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지만― 걸어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아파트는 그저 집의 한 형태에 불과했고, 도시란 바깥의 공간, 즉 오픈스페이스였다. 단지 밖을 나가 중앙 길을 걷다 보면 동그란 소나무 조경 공간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큰 도로를 향해 걷다 보면 올림픽 광장 이 나왔으며, 또 한 번 큰 길을 건너면 올림픽공원에 도착했다. 내가 살던 동호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걸어 다니는 길과 공원은 기억하다니. 랜드마크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이기에, 어떤 일상의 경험이 조합되어 공원을 도시의 방점으로 인지했을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공원, 어떤 목적을 지닌 땅
그래서일까. ‘자연’은 공원과 동의어였다. 아니, 적어도 그 당신의 나에게는 공원이 자연의 원형 (prototype)에 더 가까웠을지 모른다. 학교에 다니고 지역을 옮기며 점차 공원과 자연의 구분이 생겼 지만, 학교에서 배운 자연은 그림 속에 나오는 산이라는 것에 불과했고 공원의 자연은 내가 살아 가는 공간이었다. 학교에서 백일장을 여는 곳도 공원, 체육대회를 여는 곳도 공원, 교내 마라톤 대 회조차 공원에서 했으니 익숙함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대자연의 원형 을 실제 자연이 아닌 풍경화(landscape painting)에서 찾았던 18세기 영국의 정원가들처럼, 또는 자연 스러운(nature-like) 공원 형태를 미국의 황야가 아닌 영국 정원에서 찾은 미국의 조경가들처럼, 자 연의 원형을 심상image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오히려 실제가 아닌 심상에 기반했기에 공원은 도시 의 새로운 공간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연을 닮기를 바라면서도 자연과 완전히 다른,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공간이 정원이라면, 공 원은 그 개념을 도시로 확장하는 동시에 ‘도시의 다른 곳과 구분되는 특정 기능’을 지는 곳으로 세부화 됐다. 공원(park)의 어원은 ‘위요된 일정 규격의 땅’을 의미하는 4세기 이전 옛 서부 게르만 어 ‘파루크(parruk)’로 거슬러 올라간다.1 이후 중세 프랑스어와 중세 영어로 발전하며 보다 주체적 으로 ‘왕의 숲royal forest 등에서 사냥에 쓰이기 위한 짐승을 키우는 곳’으로 의미하게 됐다. 여기서 분화해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구획된 자연을 의미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 이 ‘주차하다’라는 의미의 ‘파킹parking’이다. 설핏 보면 굉장히 다른 의미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닌 땅’이라는 공통분모가 남아 있다.
공원 내부만을 본다면, 특정한 목적 없이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서너 걸 음 뒤에서 시야를 넓혀 보면, 공원은 그것을 포괄하는 도시와 분명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 드러난다. 여기서 목적이란 ‘현대 도시의 생산적 기능과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공원 이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고, 강아지와 프리스비를 ‘던질 수 있는’ 공간이며, 돗자 리를 펴고 한강을 바라보며 뜨거운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생산적 효율성과 기능이 켜켜 이 쌓아 올라간 도시 한복판에서 이처럼 자유로움이 넘실거리는 공간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매 순간 체험하게 만드는 도시의 고유한 공간이다.

에피소드 2
완성된 작품은 과연 작가의 것일까?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겠다며 한창 미술사 공부에 열을 올리 던 내게 울림처럼 다가온 어느 교수님의 화두였다.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을지언 정, 그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때문에 작품은 여러 개의 삶(multiple lives of a work of art)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작품이 거쳐 가는 여러 삶은 과 연 작가의 것일까?
에피소드 3
1998년 겨울, 매주 토요일 오후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워싱턴 DC 몰(The Mall)을 따라 걸으며 당시 내가 가장 좋아하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고전주의 특유의 하얗고 높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 고풍스러운 갈색 현관이 있었고, 로비에 들어서면 나를 반겨주던 공룡 뼈 전시가 있었다.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특별전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 당시 언어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었던 우리 가족에게 박 물관만큼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 없었다.

박물관을 나와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를 향해 천천히 걷곤 했다. 날이 좋으면 멀리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까지도 도전하곤 했다. 특히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5월이면 잔디밭 광장에 피크닉 돗자리를 펴놓고 따스한 햇빛 아래서 시간을 보내는 인파가 몰렸는데, 햇빛은 무조건 피하라는 조언을 듣고 자란 내게 그렇게 신기한 광경이 없었다. 태양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 재란 태양볕을 쐬면 안 되는 사람의 존재만큼이나 놀라웠다.
그러니까, 먹물 뺀 공원 썰
여러 국가의 공원에서 일상을 보내던 것이 대학원에 가서야 어떤 구분할 수 있는 특정한 경험으로 인지됐다. 일상의 놀라움 혹은 무서움이 아닌가 싶다. 그 어떤 놀라운 스펙터클도 그것이 일반화 되어버리는 순간 아무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데, 공원이란 곳은 완전히 반대였다. 물론 그만큼 일 상에서 편하게 향유하던 공원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는 분석과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사 실이다.
필자는 공원이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예전의 관점과 공원이 연구의 대상인 현재 사이, 어느 중 간 지점에서 양쪽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의 부분들이 모두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 배경 에 공원이 있었던 개인적 기억과 연구자로서 공원을 살펴보는 층위적 시야가 합쳐지면 무언가 재 미있(을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소위 먹물을 뺀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어떤 그림이 나타 날까. 공원이 일상의 장에서, 관심의 공간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필자에게 의미 있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다가가길 바란다.
각주 정리
1."Park”, Merriam-Webster Dictionary.
신명진은 뉴욕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와 협동과정 조경학전공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친 문어발 도시 연구자다. 현재 예술, 경험, 진정성 등 손에 잡히지 않는 도시의 차원에 관심을 두고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도시경관 매거진 『ULC』의 편집진이기도 하며, 종종 갤러리와 미술관을 오가며 온갖 세상만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 @jin.every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