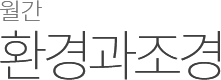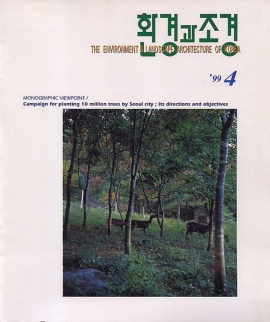자연을 감상하는 감칠 맛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는 비가 개인 뒤의 인왕산을 그린 진경산수화로 정선(鄭敾,1676∼1759)만의 독특한 필법과 화풍이 상큼하게 드러났다. 한 번은 이 그림이 일본에 전시되었는데, 몇 시간을 미동도 않고 감상하던 한 일본인이 그림을 향해 넙죽 절을 올리더니 눈물까지 흘렸다는 실화가 신문에 실렸다. 왜 그랬을까? 인왕제색도는 실경을 그린 그림은 확실하나 그렇다고 사진을 찍듯이 모습 그대로를 그린 것은 아니다. 현재
의 인왕산과 대조해 보면, 실경 중에서 작가의 마음속에 함축된 이미지만 취사 선택하였고, 또 작가의 위치도 자연의 정수(精髓)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가상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아비뇽의 아가씨들’에서 보듯이 사물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파괴한 피카소의 안목과도 비교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에 놀라 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다른 명화에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천재의 뛰어난 독창성이 무르녹았을 것이다. 그 점은 용인대의 이희중 교수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산수화는 예술 장르 특성상 2차원의 평면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속의 정취(情趣)를 나타내고자 했던 바 삼원법이란 시간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구도법을 통해 우리는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공간을 4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이동 시점에 의한 운동감과 시간성이 결합된 4차원의 공간인 정원 공간을 체험할 수있다.( 「환경과조경」, 1997년 9월호 즉, 이 그림에서 작가는 화면의 무게중심을 중간의 나무숲에 둔 채, 의연한 양감(量感)이 강조된 주봉은 밑에서 올려다보고, 은자가 머물 듯한 가옥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삼원적 구도로 그렸다. 그 결과 가옥과 중앙의 산능선 그리고 주봉 사이를 비록 공백으로 처리했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을 싱그럽게 선사한다. 하지만 내려다 본 가옥 부분을 가린 채 감상한다면, 이제는 공간이 연무가 아니라 산 중턱을 흘러가는 운무(雲霧)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화면에 나타난 변화와 활력은 사정없이 약해져 버린다. 이처럼 화면에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무쌍함을 가득히 불어넣은 탁월한 시각적 구도에 일본인은 탄복했을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 전통 정원의 계획 원리는 삼원적 구도로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조경에 대한 한국적 풍수관이라 볼 수도 있다.
※ 키워드:전통조경, 풍수적 한국성, 조경의 중심
※ 페이지:76~79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