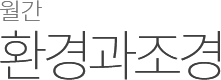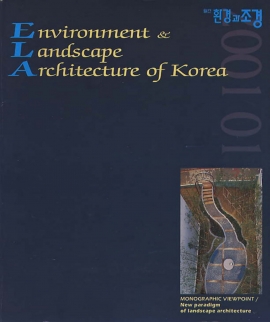벌써 6년이나 흘렀을까? 1994년 그 해 여름 압록강변의 집안(集安)시를 찾은 일이 있었다. 통화(通化)에서 5시간 넘게 흔들리면서 통구하(通溝河)를 굽이치다 대우산(大禹山), 의룡산(依龍山), 칠성산(七星山)을 배경으로 강변에 흩어진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된 것이다. 졸본(卒本)시대 이후 425년 동안 중국의 동북삼성(東北三省)과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석권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에 필자가 느낀 형언할 수 없는 전율과 진한 감동은 오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강변 따라 그 넓은 벌판을 메우고 있는 고분군(11258개)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왜곡된 역사관도 지워지지 않는 충격으로 함께 남아있다. 당시 통역을 도와주던 조선족 안내양은 그저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중국의 젊은이였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귀국 후 필자의 기(氣)가 남아 있는 한 우리의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원(祈願)하는 것으로 오늘을 다짐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의 연변(延邊)지방 여러 곳의 발해 유지와 문물들에 대한 자료들을 대강 더듬기만 하였는데, 돈화시(敦化市) 근처 발해의 발원지에서는 1대 왕이었던 대조영(大祚榮)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고, 2대 왕이었던 대무예(大武藝)의 능, 제3대 왕인 대흠무(大欽武)의 둘째딸 정혜(貞惠)공주의 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상의 해동성국(海東盛國)을 이루었던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지금의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도 연길에서는 한나절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발해 오경(五京)의 하나였다는 훈춘시 근교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자리에는 평원성 4개와 산성 2개, 절터 4곳 탑자리 1곳 등이 있다하고, 그중 팔연성(八連城) 유지는 기원 785년부터 794년까지의 서울이었다 하니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거리였다. 또한 중경현덕부(中京縣德府)로 인정하고 있는 서고성(西古城)은 화룡시(和龍市)입구 백두산으로 가는 공로상에 인접되어 있으나 막상 지나치기만 하던 곳이었다. 마침 이 근처에는 대흠무의 넷째딸인 정효(貞孝)공주의 무덤도 1980년도에 발굴되었다 하니 이 곳 역시 찾을만한 곳이 된다. 이외에도 연변일대에는 무수한 발해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중 연길시 부르하통하와 해란강이 합수되는 곳에 위치한 성자산성(城子山城)도 필히 찾을만한 곳으로 꼽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러한 곳들을 한번도 답사할 기회가 없었다. 매번 연변을 찾을 적마다 일정의 여유가 없었고, 모처럼 일행을 안내했던 그곳 동포들은 고대사(古代史)에 대한 흔적을 굳이 밝히려 들지 않았었다. 필자 역시 역사에 대한 미묘한 해석과 복잡한 논란을 피하려는 그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리 기대하지도 않았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던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금번 여행에 대한 사유를 한가지 더 보탠다면, 1997년 5월부터 1999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한국의 중소도시 공원을 답사했던 것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 도시공원의 배경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나, 주로 지역사회의 사적지를 교화의 목적으로 정비한 곳으로서 처절한 역사의 기록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기에는 너무도 치욕으로 얼룩진 흔적들뿐이었다. 도시의 입지적 여건에 따라 내용의 차이는 있었지만 삼국시대 이래 근세에 이르기까지 애국과 충절을 기리겠다는 의도적 해석을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전달에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섬나라 사람들은 몇 세기에 걸친 필사적인 시비로 육지에 오르려 하고, 중원(中原)대륙의 끝이라는 조건 때문에 정복의 대상으로 시달림만 받아야 했으니 그 언제 대륙을 호령하던 선조들의 기백과 기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발자취나마 더듬어 지난 역사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근대사 이후 우리의 새로운 지표(指標)를 찾는 것으로서 이에 대신하고자 금번의 여행길을 겸하게 된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장태현 Jang, Tae Hyun ·청주대학교 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
댓글(0)
최근순
추천순